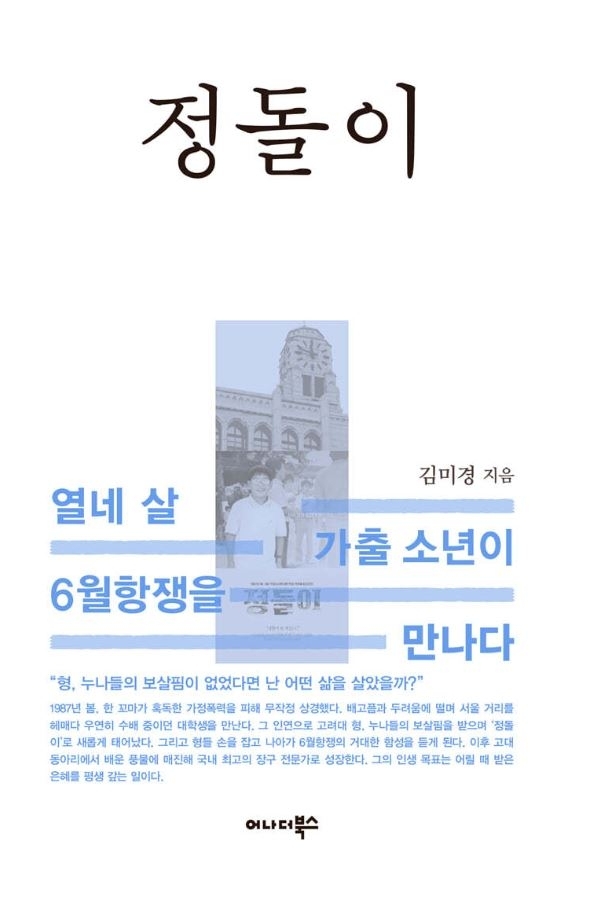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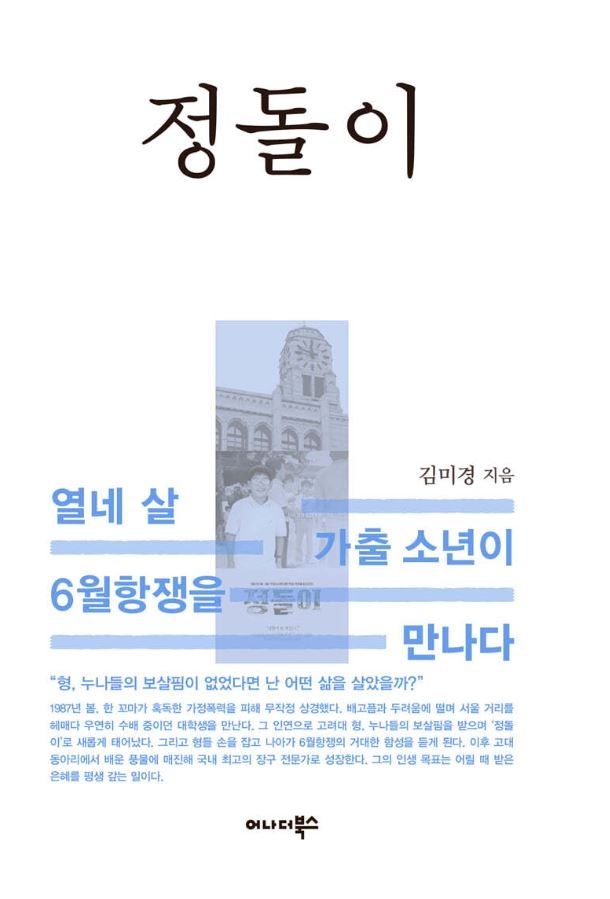
『정돌이』 김미경 지음/ 어나더북스
‘정돌이’ 이야기는 단순하고, 현재까지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1974년생 송귀철의 어린 시절 가정환경은 비참했다. 술과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 탓이었다. 1987년 봄 14살 귀철은 지옥을 탈출해 무작정 서울로 왔다. 서울의 어느 골목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조용히 스러졌다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던 그를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장구재비로 키워낸 것은 ‘네 이웃을 돌아보라’는 박애(博愛)였다.
‘서럽게 울어 서울’이라는 삭막한 도시, 오갈 데 없는 가출 소년을 처음 안아준 사람은 남산에서 리어카를 끌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던 중년의 아저씨였다. 둘이 눕기에 좁은 쪽방에서 귀철을 재우고 라면을 끓여주던 아저씨는 젊은 청년과 누나에게 귀철을 맡겼다. 그들을 따라간 곳은 공장이었다. 거기서 상품 포장 일을 맡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나 싶었을 때 공장 간부가 귀철이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 분노해 싸움을 벌인 형 때문에 셋 다 공장을 떠나야 했다.
다시 회현동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며 떠돌던 귀철에게 오락실 아저씨는 일부러 몇 가닥 남긴 자장면 그릇을 넘겨 주었다. 어느 밤 청량리역에서 험상궂은 청년을 피해 경동시장 쪽으로 도망치다 한숨을 돌리기 위해 멈춘 빌딩 앞 화단 턱에 얼굴이 뽀얗고 우울해보이는 청년이 앉아있었다. 훈풍이 불었고 보름달은 환했다. 귀철은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그 청년이 자기를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달이 참 밝아요.”
“뭐?”
“달이 참 이쁘게 밝다구요.”
“넌 누구니?”
마치 생텍쥐뻬리가 사막에서 『어린왕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처럼 둘은 뜬금없는 첫 대화를 나눴다. 청년은 1984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한 ‘서정만 학생’이었고 민주화 운동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 중이었다. 어린 귀철을 내버리지 못한 정만은 그를 데리고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실로 갔다. 그때부터 귀철을 키운 것은 진규 형, 병준 형, 인숙 누나 등 고려대 운동권 학생들, 엄마손식당, 고모집 등 ‘범 고대’였다. ‘정돌이’라는 별명이 이름을 대체했다. 도봉산 암자에 들어가 공부할 것을 권했던 혜숙 누나는 “잘 커야 한다. 알았지?” 하며 그를 보살폈고, 고모집 식당 주인 할머니는 “심부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 겨울을 여기서 나거라.”며 정돌이를 품었다.
학생 시위나 농활에도 따라나선 정돌이는 사회적 의식이 아니라 자신을 따듯하게 품어준 형, 누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으로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때 처음으로 고려대 농악대에서 장구채를 손에 잡은 정돌이는 이후 미친 듯이 전문 장구재비의 길에 매달린 결과 사물놀이 극단 <미르>를 열어 공연과 제자 양성 등을 하며 국악을 전공한 예술 강사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이 셋의 아빠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송귀철의 인생 이야기는 어린 그를 품었던 고려대 학생 중 한 명이었던 김대현 감독이 영화 <정돌이>로, 김미경 작가가 신간 『정돌이』로 대중에게 알렸다. 고향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인 『정돌이』는 1980년대 서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기록한 박애의 역사이자 ‘586’의 소중한 추억이다. 이를 애써 소환해준 감독과 작가, 국악인 ‘정돌이 송귀철’의 앞날에 무궁한 행운이 함께 하길, 그리고 삼가 고(故) 서정만 님의 명복을 빈다.
최보기 책글문화네트워크 대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