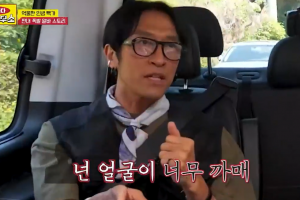1863년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남북전쟁 직후였다. 해방 흑인들은 노동력밖에 없었다. 식료품이나 옷을 살 돈이 필요했다. 농장주에게 전차금(前借)을 받고 일했다. 일종의 선급금(先給)이었다. 전차금엔 높은 이자가 매겨졌다. 노동자들은 늘 빚에 쪼들렸다. 해방 흑인뿐만 아니었다. 가난한 백인도 마찬가지였다. 전차금 제도는 신(新)노예계약이었던 셈이다. 이런 악순환은 남부의 농업을 더 뻗어나지 못하게 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런 나라는 허다했다. 전차금이란 미리 받는 임금이었다. 일을 해서 갚기로 약정하는 돈이었다. 저임금으론 전차금을 갚기 어려웠다. 고리(高利)일수록 더했다. 근로자 착취로 이어졌다. 국가 개입은 전후에 이르러서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엄격하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을 임금으로 갚을 수는 있다. 이를테면 가불 같은 형태로 가능하다. 학자금 대여나 주택구입자금 대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임금과의 상계 조건을 달지는 못한다. 빌려 쓴 ‘빚’과 미리 받은 ‘임금’을 구분한 것이다.
현실은 법과 다르다. 빚과 임금의 경계가 모호하다. 오히려 빚으로 더 많이 쓰인다. 전차금은 일본에선 전금(前金)으로 불린다. ‘마에킨’으로 발음된다. 우리나라에선 ‘마이낑’ ‘마이킹’으로 변용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속어다. 유흥가에서 많이 쓴다.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고리의 이자가 붙기 십상이다. 여종업원들에겐 목돈이 필요하다. 성형은 아예 초기 투자다. 의상비, 주거비도 한두 푼이 아니다. 업주로부터 마에킨을 받아 충당할 도리밖에 없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도 있다고 한다.
제일저축은행이 대형 사고를 쳤다. 마에킨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했다가 탈이 났다. 유흥업소에 빌려준 규모가 1546억원에 이른다. 밤무대 종사자를 상대로 무리한 짓을 벌였다. ‘강남 유흥업소 대출 특화상품’이란 이름으로. 이를테면 아가씨 담보 대출인 셈이다. 이자가 무려 18~23%에 달했다. 멀쩡한 고객이 찾을 리 만무하다. 30개 업소는 폐업했고, 업주 36명은 신용불량자였다.
2000년 음반 발행이 연간 4000만장을 넘었다. 당시 음반업계는 전속금 명목으로 마에킨을 줬다. 마에킨이 수십억원에 달한 가수도 있었다. 마에킨은 몸값을 가늠하는 척도다. 하지만 수입이 보장될 때 얘기다. 그러지 못하면 마에킨의 노예가 된다. 어느 분야든 예외가 없다. 그 위험률은 액수와 정비례한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런 나라는 허다했다. 전차금이란 미리 받는 임금이었다. 일을 해서 갚기로 약정하는 돈이었다. 저임금으론 전차금을 갚기 어려웠다. 고리(高利)일수록 더했다. 근로자 착취로 이어졌다. 국가 개입은 전후에 이르러서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엄격하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을 임금으로 갚을 수는 있다. 이를테면 가불 같은 형태로 가능하다. 학자금 대여나 주택구입자금 대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임금과의 상계 조건을 달지는 못한다. 빌려 쓴 ‘빚’과 미리 받은 ‘임금’을 구분한 것이다.
현실은 법과 다르다. 빚과 임금의 경계가 모호하다. 오히려 빚으로 더 많이 쓰인다. 전차금은 일본에선 전금(前金)으로 불린다. ‘마에킨’으로 발음된다. 우리나라에선 ‘마이낑’ ‘마이킹’으로 변용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속어다. 유흥가에서 많이 쓴다.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고리의 이자가 붙기 십상이다. 여종업원들에겐 목돈이 필요하다. 성형은 아예 초기 투자다. 의상비, 주거비도 한두 푼이 아니다. 업주로부터 마에킨을 받아 충당할 도리밖에 없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도 있다고 한다.
제일저축은행이 대형 사고를 쳤다. 마에킨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했다가 탈이 났다. 유흥업소에 빌려준 규모가 1546억원에 이른다. 밤무대 종사자를 상대로 무리한 짓을 벌였다. ‘강남 유흥업소 대출 특화상품’이란 이름으로. 이를테면 아가씨 담보 대출인 셈이다. 이자가 무려 18~23%에 달했다. 멀쩡한 고객이 찾을 리 만무하다. 30개 업소는 폐업했고, 업주 36명은 신용불량자였다.
2000년 음반 발행이 연간 4000만장을 넘었다. 당시 음반업계는 전속금 명목으로 마에킨을 줬다. 마에킨이 수십억원에 달한 가수도 있었다. 마에킨은 몸값을 가늠하는 척도다. 하지만 수입이 보장될 때 얘기다. 그러지 못하면 마에킨의 노예가 된다. 어느 분야든 예외가 없다. 그 위험률은 액수와 정비례한다.
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11-10-0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