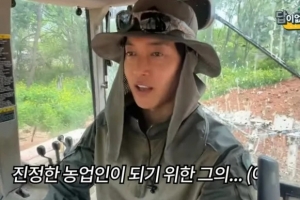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첫째는 투표율이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세대 투표라는 것인데, 수가 많은 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당에는 당연히 비상이 걸렸다. 둘째는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장이 된 박원순 후보는 이기고자 (야당과)경선은 했지만, 결코 그 야당의 후보가 되지는 않았다. 정치권의 무게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정치인이 바뀌길 바란다. 정치를 정치 바깥의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월 28일 자 1면에서 이런 현상을 ‘소통’과 ‘생활정치’, ‘심판’을 키워드로 설명했다. 기존 정치의 화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치·리더십·문화가 온 국민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란 무엇일까? 이 키워드의 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자기만의 독단, 이념적 색깔 정치, 기득권층 위주 등이다. 이제 이런 정치는 구태의 전형이며, 언론이 정치를 판단할 때 좋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인이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게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정치인 물갈이는 국회의원의 공천 때마다 앓는 홍역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국회는 매양 그 판이다. 과반수를 바꾸어도 달라진 게 없다. 마치 블랙홀 같다. 이런 판에는 설사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도 선뜻 몸을 담기가 꺼려진다. 한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런 점이 정치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여론조사 1위로 올려놓은 배경일 것이다.
다소 빤하다면 빤한 이런 상식을 언론은 자주 어긴다. 서울시장 선거 다음에 서울신문을 보는 느낌이 그렇다. 예를 들면 안철수 원장의 정치 입문을 격앙되게 권하는 11월 5일 자 ‘서울광장’ 같은 것이다. 기명 칼럼이므로 굳이 따리를 붙일 것은 못 되지만, 여기에는 앞 기사의 “안 원장이 박 시장을 편들지 않고, 진영 대결을 유도하지 않았던 점 … 투표와 참여, 변화 등 보편적 가치를 주장”한 점이 시민들에게 어필했다는 인식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문제는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원칙에 불과한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먹힌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 메시지는 특정 당파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그가 “구름 위에서 장풍 쓰는 것”(앞의 ‘서울광장’ 칼럼)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된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안철수가 지금에 이르러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 데 일등 공신은 정치권이다. 좁혀 말해 청와대요 여당이다. 그가 영향력을 만든 곳은 작은 극장이며 인터넷이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위력적인 매체가 아니다. 또 그는 정치를 바꾸자는 순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온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더욱 위력적이라는 점은 그런 사실을 만들 수 없는 정치권이 가장 잘 안다.
미국의 정치학자 패터슨은 미국 언론이 정치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보도를 일삼는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패터슨에 따르면 이런 보도는 국민과 정치의 괴리를 심화시켜 과도한 정치 불신과 낮은 정치 참여를 낳는다. 한때 ‘정치적 선정주의’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우리 언론도 이런 평가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를 정치권으로 부르는 것은 기존의 ‘때 묻은’ 정치가 같은 물에서 한판 겨루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물론 그 논리대로라면 그것이 공정 경쟁이므로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언론이 새삼 곱씹어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정치판이 고질을 벗지 못하느냐다. 저질 경쟁의 판을 갈지 못하면 그게 누구이든 결코 메시아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11-0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