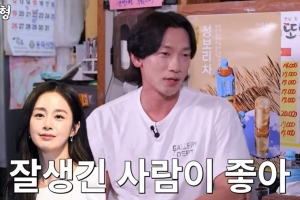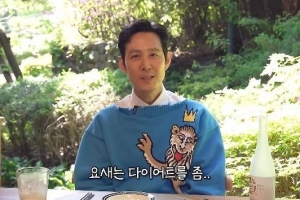정용준 작가 ‘내가 말하고 있잖아’ 출간
십대 소년의 언어·심리장애 극복기말더듬증을 삶 중심에 둔 자전적 글
예전엔 상처에 사로잡혀 겁냈지만
더 깊이 보면 괜찮단 생각까지 닿아
인간을 보여줄 수 있어 소설 좋아해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0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한 지 11년. 정용준 작가는 “문학도 하나의 ‘덕질’이라고 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하는 게 좋다”면서 이제 이 좋은 문학을 함께 나누고픈 ‘전도의 욕망’이 생겼다고 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에는 말을 더듬는 현상을 인물이 갖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생각했다면, 정면으로 그 인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썼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겪었던 일을 겪었던 방식으로 썼죠.”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작가가 말했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는 열네 살 소년 ‘나’가 언어 교정원에 다니며 언어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등단 이후 10여년 동안 황순원문학상, 문지문학상 등 굴지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오랫동안 글을 매만졌다.
이른바 밀레니엄 버그가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인터넷이 멈춰 전산이 마비될 줄 알았던 1999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했다. 그때의 감각을 작가는 ‘시시하다’고 기억한다.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허무했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게 제일 힘들지 않나요.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변화의 희망이라도 갖는데 말이죠.”
소설에서는 말 더듬는 소년을 향한 세상의 자극에 무반응으로 대처하며 시시한 인생을 견디는 나와, 견딜 수 없이 시시한 시절이 중첩되며 펼쳐진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는 그의 자평처럼 보기 드물게 해피엔딩에다 따뜻한 소설이다. 적어도 이 소설에서만큼은 ‘한국 소설의 어두운 계보’(김형중 문학평론가)라던 소리가 무색해 보인다. 폭력을 휘두르던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일격을 가해 경찰서에 온 ‘나’를 구하러 언어 교정원 식구들이 대규모로 나선 풍경이 그렇다.
“예전에는 상처의 감각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더 깊숙하게 쓰려고 한다”는 작가는 “전에는 제가 그 감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겁이 나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고 했다. 더 나아가 ‘자세히 목격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까지 얻었다.
나를 변호하는 교정원 식구들 중 원장과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불렸던 소설가의 언설은 문학의 본령을 상기시키는 데가 있다. 나는 일기장 속 ‘죽이고 싶다’ 등의 문장들 때문에 남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던 것으로 오해받는다. 원장은 이에 대해 “교정원에서 언어를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그건 일기장이 아니라 마음을 언어로 옮기는 연습장 같은 것”(138쪽)이라고 말한다.
작가에게도 소설과 문학이 같은 맥락이다. “제 소설이 가장 절 많이 받아줘요. 쓰고 나면, 그 부분이 저에게 사라졌거나 고쳐진 건 아닌데 어째선지 소설에 맡기고 나면 괜찮아져 있고요.” 소설 속 일기의 도움처럼 문학의 힘이 컸다는 부연이다.
그는 인간을 보여 주기에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다. “유일하게 자기가 가진 태생적 기질을 미워하는 동물이 인간인데, 그게 누구 탓인지 왜 탓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 탓을 하는지 등을 알려주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을 통한 극단적인 사고 실험으로 선과 악의 딜레마를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기형도’가 어디 섬 이름인 줄만 알았다던 러시아어과 학생은 별안간 만난 소설 덕에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것처럼 보였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0-07-0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