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ђўьІђВЮў в│ђьЎћРђЎвіћ ВІювїђВЮў ьЎћвЉљвІц. ьЋўВДђвДї ВІюВА░ВЮў ЖИИВЮђ Вбђ вІцвЦ┤вІц. ВёаьЌўВЮў ьІђВЮё ВДђьѓцвљў, ЖиИ ВєЇВЌљВёю Ж░▒ВІаВЮё ВЮ┤вБеВќ┤ВЋ╝ ьЋўЖИ░ вЋївгИВЮ┤вІц. ЖиИвъўВёю ЖИ░Вюе ВєЇВЮў ВъљВюа, ЖиаВаю ВєЇВЮў ВъљВъгвЦ╝ ВЮ┤ВЋ╝ЖИ░ьЋювІц. Ж┤ђЖ▒┤ВЮђ вїђВЃЂВЌљ вїђьЋю вѓ»Вёа Ж┤ђВаљ, ВЃѕвАюВџ┤ ьЋ┤ВёЮВЮ┤вІ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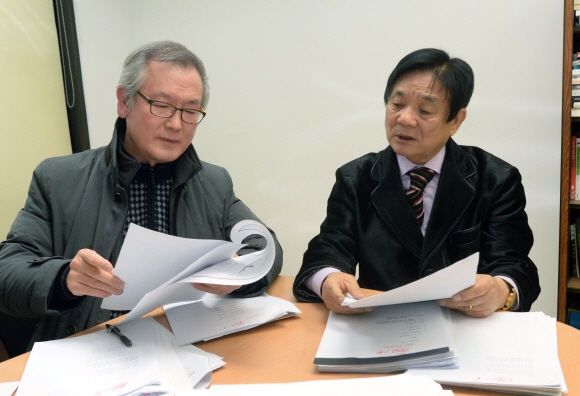
ВІгВѓгВюёВЏљ в░ЋЖИ░ВёГ(ВЎ╝Вфй) ВІюВЮИ, ВЮ┤Жи╝в░░ ВІюВЮИ.
![ВІгВѓгВюёВЏљ в░ЋЖИ░ВёГ(ВЎ╝Вфй) ВІюВЮИ, ВЮ┤Жи╝в░░ ВІюВЮИ.]() ВѕЎвЈЁ вЂЮВЌљ ВёИ ьјИВЮў ВъЉьњѕВЮ┤ ВёаВъљВЮў ВєљВЌљ вѓеВЋўвІц. ВёИ ьјИ вІц ВІюВЮў в░юьЎћЖ░ђ ВЃѕвАГЖ│а, ВІюВЃЂВЮё в░ђЖ│а Ж░ђвіћ ьъўВЮ┤ ВбІвІц. ВъЦВюцВаЋВЮў РђўвГЅьЂгВЮў ВўцьЏёРђЎвіћ вГЅьЂгВЮў ВаѕЖию ВЮ┤в»ИВДђВЌљ вЁИВѕЎВЮў ьњЇЖ▓йВЮ┤ Ж▓╣В╣ювІц. ВбЁВъЦВЮў в░ђвЈёвЦ╝ В┤ѕ┬иВцЉВъЦВЮ┤ в░ЏВ│љ ВБ╝ВДђ вф╗ьЋю Ж▓ї ьЮаВЮ┤вІц. ВаЋВўЂьЮгВЮў РђўВќ┤вдёВѓгвІѕРђЎвіћ ЖйЃЖ│╝ Вќ┤вдёВѓгвІѕВЮў в╣ёВюавЦ╝ ьєхьЋ┤ в╣ЏЖ│╝ Вќ┤вЉаВЮў Ж▓йЖ│ёвЦ╝ ВДџЖ│а ВъѕвІц. вгИВаювіћ ВІюВќ┤ВЮў в░ўв│хВЮ┤ ВІюВЃЂВЮў ВаёьЎўВЮё вДЅвіћвІцвіћ ВаљВЮ┤вІц. вЉљ ьјИВЮё вѓ┤вацвєЊВъљ вДѕВДђвДЅ вѓеВЮђ ВъЉьњѕВЮ┤ ВєАЖ░ђВўЂВЮў РђўвДЅВѓгв░юВЮё ВЮйвІцРђЎвІц. ВЮ┤вЦ╝ Вю╝вюИВъљвдгВЌљ Вўгвд░вІц.
ВѕЎвЈЁ вЂЮВЌљ ВёИ ьјИВЮў ВъЉьњѕВЮ┤ ВёаВъљВЮў ВєљВЌљ вѓеВЋўвІц. ВёИ ьјИ вІц ВІюВЮў в░юьЎћЖ░ђ ВЃѕвАГЖ│а, ВІюВЃЂВЮё в░ђЖ│а Ж░ђвіћ ьъўВЮ┤ ВбІвІц. ВъЦВюцВаЋВЮў РђўвГЅьЂгВЮў ВўцьЏёРђЎвіћ вГЅьЂгВЮў ВаѕЖию ВЮ┤в»ИВДђВЌљ вЁИВѕЎВЮў ьњЇЖ▓йВЮ┤ Ж▓╣В╣ювІц. ВбЁВъЦВЮў в░ђвЈёвЦ╝ В┤ѕ┬иВцЉВъЦВЮ┤ в░ЏВ│љ ВБ╝ВДђ вф╗ьЋю Ж▓ї ьЮаВЮ┤вІц. ВаЋВўЂьЮгВЮў РђўВќ┤вдёВѓгвІѕРђЎвіћ ЖйЃЖ│╝ Вќ┤вдёВѓгвІѕВЮў в╣ёВюавЦ╝ ьєхьЋ┤ в╣ЏЖ│╝ Вќ┤вЉаВЮў Ж▓йЖ│ёвЦ╝ ВДџЖ│а ВъѕвІц. вгИВаювіћ ВІюВќ┤ВЮў в░ўв│хВЮ┤ ВІюВЃЂВЮў ВаёьЎўВЮё вДЅвіћвІцвіћ ВаљВЮ┤вІц. вЉљ ьјИВЮё вѓ┤вацвєЊВъљ вДѕВДђвДЅ вѓеВЮђ ВъЉьњѕВЮ┤ ВєАЖ░ђВўЂВЮў РђўвДЅВѓгв░юВЮё ВЮйвІцРђЎвІц. ВЮ┤вЦ╝ Вю╝вюИВъљвдгВЌљ Вўгвд░вІц.
РђўвДЅВѓгв░юВЮё ВЮйвІцРђЎвіћ ВаёьєхВЮў ВъгьЋ┤ВёЮВЮИ вЈЎВІюВЌљ, В▓ўВЌ░ьЋю ВЃЮВЮў ВёюВѓгвІц. вДЅВѓгв░юВЮў РђюВЮђВюаРђЮ ВєЇВЌљ РђюьёИвдгЖ│а ВДЊв░ЪьъѕЖ│а ВЊИРђЮвд░, вўљ ЖиИваЄЖ▓ї РђювХђвЦ┤ьі╝ ВЃЮВЮё вЅювІц.РђЮ ВёИВЃЂВЌљ ВЮ┤в│┤вІц РђювёѕвЦИ ьњѕВЃѕРђЮвЦ╝ Ж░ђВДё ЖиИвдЄВЮђ ВЌєвІц. вДЅВѓгв░юВЮђ вДЅ ВЇ╝вІцЖ│а вДЅВѓгв░юВЮ┤вІц. Рђюв░ћвъїВЌљ вфИВЮё вДАЖИ┤ Ж░ђв▓╝Вџ┤ вёѕВЮў ьќЅв│┤РђЮВЌљВёю ЖиИвЪ░ ьјИвфеЖ░ђ вЊювЪгвѓювІц. ЖиИвЪгвѓў РђюВќЉВДђ вюИ ВЋёвіЉьЋю вЋЁВЌљРђЮ вг╗ьўћвІц Ж╣еВќ┤вѓўвіћ ВѕюЖ░ё, вДЅВѓгв░юВЮђ вЇћВЮ┤ВЃЂ вДЅВѓгв░юВЮ┤ ВЋёвІѕвІц. Рђювѕѕв╣Џ вДЉВЮђ ВўЏ вЈёЖ│хВЮў ВєљЖИИВЮё вљўВДџРђЮвіћ вг┤ВІгВЮў ЖиИвдЄВЮ┤Вџћ, РђюЖ░ђВі┤ВЌљ вХѕЖйЃВЮё вг╗ВЮђ ьЂ░ ЖиИвдЄРђЮВЮ┤ вљўвіћ Ж▓ЃВЮ┤вІц. ьЉюьўёВЮў в░ђвЈёЖ░ђ вєњЖ│а, вїђВЃЂЖ│╝ ВІгВЃЂВЮў Ж▓░ВєЇВЮ┤ вЏ░Вќ┤вѓю ВъЉьњѕВЮ┤вІц.
ВаЋВДёьЮгВЮў РђўвЁИвъЉвЈїВЕїЖиђРђЎ, ВёюьЮгВЮў РђўВ▓Ф в▓ѕВДИ, ьЋю вЂ╝РђЎ, Ж│авХђВЮў РђўЖ▓еВџИ ЖхгЖ░ЋьЈгРђЎ, ВЮ┤ВюцьЏѕВЮў РђўьїївЮ╝вІцВЮ┤Віц ьњЇЖ▓йРђЎ, вѓўвЈЎЖ┤ЉВЮў РђўЖ░Ћвг╝ВѕўВЌЁРђЎ, ВЮ┤ВўѕВЌ░ВЮў РђўьЌѕвг╝РђЎ вЊ▒ВЮђ ВхюВбЁВІгВЮў вг┤вїђвЦ╝ в╣ЏвѓИ Ж░ђВъЉвЊцВЮ┤вІц. Вџ░вдг Ж│ЂВЌљ Вўе вўљ ьЋю ВѓгвъїВЮў ВІюВЮИВЮё в░ЋВѕўвАю вДъВю╝вЕ░, вфевЊа ьѕгЖ│аВъљвЊцВЮў ВаЋВДёВЮё в╣ѕвІц.
ВІгВѓгВюёВЏљ в░ЋЖИ░ВёГ ВІюВЮИ, ВЮ┤Жи╝в░░ ВІюВЮ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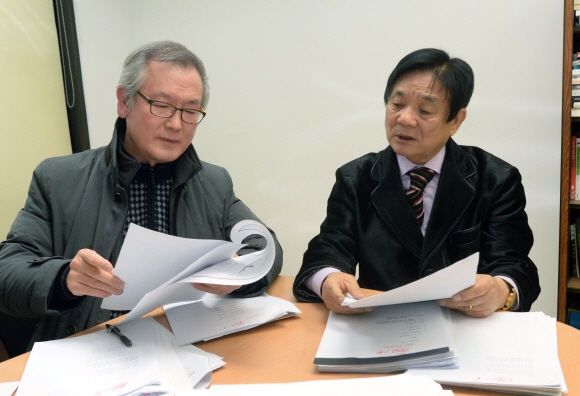
ВІгВѓгВюёВЏљ в░ЋЖИ░ВёГ(ВЎ╝Вфй) ВІюВЮИ, ВЮ┤Жи╝в░░ ВІюВЮИ.
РђўвДЅВѓгв░юВЮё ВЮйвІцРђЎвіћ ВаёьєхВЮў ВъгьЋ┤ВёЮВЮИ вЈЎВІюВЌљ, В▓ўВЌ░ьЋю ВЃЮВЮў ВёюВѓгвІц. вДЅВѓгв░юВЮў РђюВЮђВюаРђЮ ВєЇВЌљ РђюьёИвдгЖ│а ВДЊв░ЪьъѕЖ│а ВЊИРђЮвд░, вўљ ЖиИваЄЖ▓ї РђювХђвЦ┤ьі╝ ВЃЮВЮё вЅювІц.РђЮ ВёИВЃЂВЌљ ВЮ┤в│┤вІц РђювёѕвЦИ ьњѕВЃѕРђЮвЦ╝ Ж░ђВДё ЖиИвдЄВЮђ ВЌєвІц. вДЅВѓгв░юВЮђ вДЅ ВЇ╝вІцЖ│а вДЅВѓгв░юВЮ┤вІц. Рђюв░ћвъїВЌљ вфИВЮё вДАЖИ┤ Ж░ђв▓╝Вџ┤ вёѕВЮў ьќЅв│┤РђЮВЌљВёю ЖиИвЪ░ ьјИвфеЖ░ђ вЊювЪгвѓювІц. ЖиИвЪгвѓў РђюВќЉВДђ вюИ ВЋёвіЉьЋю вЋЁВЌљРђЮ вг╗ьўћвІц Ж╣еВќ┤вѓўвіћ ВѕюЖ░ё, вДЅВѓгв░юВЮђ вЇћВЮ┤ВЃЂ вДЅВѓгв░юВЮ┤ ВЋёвІѕвІц. Рђювѕѕв╣Џ вДЉВЮђ ВўЏ вЈёЖ│хВЮў ВєљЖИИВЮё вљўВДџРђЮвіћ вг┤ВІгВЮў ЖиИвдЄВЮ┤Вџћ, РђюЖ░ђВі┤ВЌљ вХѕЖйЃВЮё вг╗ВЮђ ьЂ░ ЖиИвдЄРђЮВЮ┤ вљўвіћ Ж▓ЃВЮ┤вІц. ьЉюьўёВЮў в░ђвЈёЖ░ђ вєњЖ│а, вїђВЃЂЖ│╝ ВІгВЃЂВЮў Ж▓░ВєЇВЮ┤ вЏ░Вќ┤вѓю ВъЉьњѕВЮ┤вІц.
ВаЋВДёьЮгВЮў РђўвЁИвъЉвЈїВЕїЖиђРђЎ, ВёюьЮгВЮў РђўВ▓Ф в▓ѕВДИ, ьЋю вЂ╝РђЎ, Ж│авХђВЮў РђўЖ▓еВџИ ЖхгЖ░ЋьЈгРђЎ, ВЮ┤ВюцьЏѕВЮў РђўьїївЮ╝вІцВЮ┤Віц ьњЇЖ▓йРђЎ, вѓўвЈЎЖ┤ЉВЮў РђўЖ░Ћвг╝ВѕўВЌЁРђЎ, ВЮ┤ВўѕВЌ░ВЮў РђўьЌѕвг╝РђЎ вЊ▒ВЮђ ВхюВбЁВІгВЮў вг┤вїђвЦ╝ в╣ЏвѓИ Ж░ђВъЉвЊцВЮ┤вІц. Вџ░вдг Ж│ЂВЌљ Вўе вўљ ьЋю ВѓгвъїВЮў ВІюВЮИВЮё в░ЋВѕўвАю вДъВю╝вЕ░, вфевЊа ьѕгЖ│аВъљвЊцВЮў ВаЋВДёВЮё в╣ѕвІц.
ВІгВѓгВюёВЏљ в░ЋЖИ░ВёГ ВІюВЮИ, ВЮ┤Жи╝в░░ ВІюВЮИ
2017-01-02 37вЕ┤
Copyright РЊњ ВёюВџИВІавгИ All rights reserved. вг┤вІе ВаёВъг-Въгв░░ьЈг, AI ьЋЎВіх в░Ј ьЎюВџЕ ЖИѕВД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