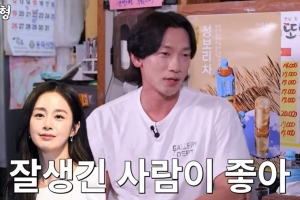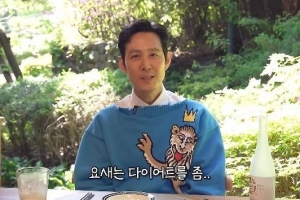일군의 경제사학자들은 막스 베버의 가산제국가 개념까지 동원, 황실이 나라 재산을 쌈짓돈처럼 빼먹었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 국가 경영 능력도, 자격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15일 성균관대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주최로 열리는 ‘조선왕조의 재정운영-원리와 이념의 시선에서’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반론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다. 징수액 증가, 제도 운영상의 폐단, 민(民)에 대한 국가의 수탈 등에 국한된 종래의 사회경제사 연구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근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의 ‘영조대 균역법 시행과 공사(公私) 논의’, 송양섭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의 ‘정조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론(宮府一體論)’ 발표는 지켜볼 만하다.
이 연구원과 송 교수는 조선 왕실의 재정을 단순히 왕실의 쌈짓돈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베버의 가산제국가론은 절대군주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선 국왕은 유교이념의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절대군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학자는 숙종 때부터 시작돼 영조, 정조 때까지 왕실재정을 둘러싼 제도들이 어떻게 정비되어 가는지 조명한다.
송 교수는 “가령 왕실재정에 쓰이는 토지세를 왕실이 직접 거두다가 호조가 관할하게 한다든지, 쓸 때도 왕실 행사보다 국가의 진휼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왕실의 사(私)재정적 성격을 크게 희석시켰다.”면서 “때문에 조선 왕실의 재정은 온전히 사적인 돈이라기보다 공적인 관료체계 안에 묶여 있었고, 이 같은 경향은 정조 때 현저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궁부’(宮府), 즉 궁궐과 관청이 하나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19세기가 규명되어야 한다. 과연 이런 틀이 계속 유지되어 갔는지 아니면 허물어졌는지, 유지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허물어졌다면 어떤 부분이 왜 허물어졌는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아직 그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조선 후기 국가재정 문제를 단순히 포악한 지방 관리의 횡포 정도로 여기기보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7-13 22면